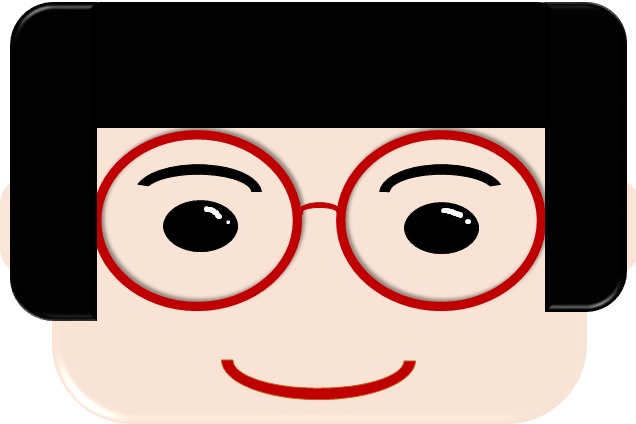나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, 완전 깡촌에서 살았었다. 과자라도 하나 사먹으려고 조그만 구멍가게까지 가려면, 마냥 걸어서 20분을 가야할 정도로 시골동네. 더 큰 문제는 과자라는 걸 사 먹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외진 시골이었다는 거.
그 시골에서도, 내가 어릴 때 살던 그 집은 그 동네에서는 나름 괜찮은 집이었다. 방이 세 개 였고 집 안에 큰 마당이 있었고 마당 앞엔 밭과 우물, 그 동네를 대표하는 감나무가 있는 그럭저럭 큰 집 이었다. 나는 우리(할머니) 집이 그 동네 제일 가는 부잣집일 줄 알았다.
사실, 어렴풋하게나마 알고는 있었다. 그 동네 제일 가는 부잣집은, 동네 어귀에 소를 많이 키우던 홍씨 아저씨네라는 걸. 하지만, 마당 바로 앞에 커다란 산이 바로 보이는, 산이 더 가까운 우리집이 더 크고 좋다고 생각했다. 산은 우리한테는 놀이터였으니까. 산엔 산딸기와 크고 작은 개울, 풀숲과 포도밭 등 장난감과 놀이터가 많았다.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었다.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때까지도, 할머니 살던 그 집은 내 맘 속에선 굉장한 부잣집이었다. 스므살 정도 됐을 때까지도 대충 그렇게 생각했었다.
하지만 할머니가 아프시고 난 후로 식구는 다 떠났다. 헐값에 세를 놓기도 했었지만, 그것도 몇 년 못 갔다. 오륙년 전부터는 그 집엔 아무도 살지 않았고, 삼 년 전에 가봤을 때는 휑한 집과 마당한 풀이 무성했다. 집은 아주 작게 보였고 흉가 같았다. 올해에 다시 찾았을 땐, 집이 없었다. 그 크던 집은 다 부숴졌고 집 터만 덩그렇게 남아 있었다.
덩그러니 집터만 남은 땅을 보니 '참, 쓸쓸하구나.'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.
그렇게 집터를 살펴보고, 동네에 여전히 살고 계시는 몇 안되는 동네 어르신들을 방문했다. 어르신들도 이젠 다 칠순 필순 어르신이 되었고, 동네를 또는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남아계신 분들보다 많았다.
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. 영원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사진에만 있는 것들이 태반이다. 우리도 이렇게 늙어가는데, 풍경이 길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변할 걸 뭐람.
아빠 돌아가시고 삼년 만에 아빠를 보내드린 곳을 다시 찾았다. 아빠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, 나도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집과 그 앞에 산.
그런데 흉가같았던 그 집 마져도 이제는 흔적도 없고, 아빠 를 보내드린 그 산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사라졌더라. 산으로 이어지는 유일한, 아주 좁다란 외길은 너무 험해서 도저히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.
참 야속하지.
멀리서, "아빠 안녕." 인사를 했다.
같이 갔던 엄마는 외길 앞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했고 나는 애써 밝게 인사를 했다.
"아빠 안녕. 날 풀리면 다시 올 게."
시간이 간다는 게, 세월이 흐른다는 게 참 무섭고 슬픈 거구나.
어차피 일어날 일은, 오늘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. 그러니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를 연민하며 챙겨주고 서로를 웃게 해주면 그만이지 않을까.
'지극히 개인적인 > 감성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여러분~ 제가 유투브에 나와요~ 이히히 (0) | 2023.09.20 |
|---|---|
| 나는 인간관계가 아직도 서툴다 (0) | 2023.02.15 |
| 우리집 어린이들의 음악 듣는 취향 (0) | 2022.11.22 |
| 아빠에 대한 회상 (0) | 2022.11.21 |
| 자기자신에 대해 (공개적으로) 이야기를 한다는 것 (0) | 2022.11.21 |